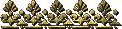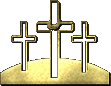창골산 칼럼 제4126호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전멜………창골산☆칼럼
|
창골산 칼럼 제4126호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小考)
|

홍종찬 목사
“시절이 하 수상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조 때 문신이었던 ‘김상헌’의 시조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에 나오는 한 구절(句節)입니다. 시조를 풀어보면, “나는 이제 떠나노라 삼각산아, 돌아와서 보자꾸나 한강수야 /정든 고국의 산천을 떠나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하니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입니다. “김상헌”은 병자호란 때 척사파로 전쟁에 패한 후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간 자로서, 이 시조는 그때에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과 체험을 직설적으로 노래한 작품입니다. 특히, 삼연에 나오는 “시절”은 “시국(時局)”을, “하”는 “몹시”를, “수상(殊常)”은 “보통 때와 달리 괴이하고 뒤숭숭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절이 하 수상하다”는 말은 “시국이 보통 때와 달리 몹시 괴이하고 뒤숭숭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는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제10장 제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제4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당이 “자유민주적”이란 말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 등 여러 SNS에서도 왈가왈부(曰可曰否) 입니다. 혹 자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보다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할지라도 여전히 민주주의로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적”이란 말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란 단어를 합친 것으로 “자유”는 목적을, “민주”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수단은 언제나 목적을 앞설 수 없습니다.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비유하는 것은 투표가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자유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거룩한 나라에 온전한 한 개체(個體)로 독립시키셨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 선악과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가서게 하는 가장 선한 행위언약이자 은혜언약의 표상으로서 날마다 치르는 투표행위였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통해 충분히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는 자연법으로부터 나온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은 사회의 규율이나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에서 유래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자연법의 의미와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정의’와 ‘법의 정의’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은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올바른 이성 또는 로고스에 따르는 완전히 평등한 법이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법의 원천으로 신의 이성 대신 신의 의지를 강조했다. 존 로크는 자연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이미 자연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회상태로 묘사했고,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이 사회보다 앞서며 종교와 국가의 법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자유권·소유권·생존권·저항권 등을 절대적 자연권으로 선언하고 있다.”(다음백과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2:14-15)고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본성(nature)을 따라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양심의 법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머레이(J. Murray)는 “인간은 그 본성에 심어진 양심과 생각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인간들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성향은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양심의 소리를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양심”과 “증거”라는 단어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롬2:15)라고 함께 사용해서 그 의미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양심”(쉬네이데시스 συνείδησις)이란 문자적으로 “공통적 지식”, “함께 안다”라는 의미이고, “증거”(쉼마르튀레오 συμμαρτυρέω)는 “같이 간증하다”, “함께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였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이들이 연대적으로 증거하여 율법처럼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양심은 인간의 마음에서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자연법으로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고, 율법과 일치한 행동을 상당(相當)이 요구하기도 하는 인간의 ‘바른 인식의 주체’(고전 8:7-12)입니다. 칼빈(Calvin)은 양심을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하며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남아 있는 가장 원초적인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는데(고후4:2) 이러한 양심을 바울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정리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고 하셨습니다. 여기 진리란 “그 진리”(호 알레데이아 ὁ ἀλήθεια)로서 그 유일하신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이며 복입니다. 시절이 하 수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을 치켜세우고 전진해야 합니다. 출처/ 창골산 봉서방 카페 (출처 및 필자 삭제시 복제금지/꼭 지켜주세요)
창골산 원고보내주실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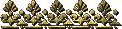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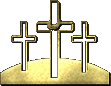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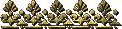
cgsbmk@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