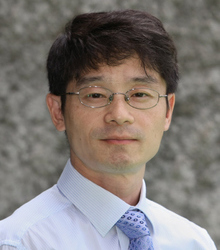
권태호
논설위원
칼럼 마감 전날 우연히 책장 한쪽에 꽂혀 있던 지난해 10월25일치 신문이 손에 잡혔다. 9월20일을 시작으로 <한겨레>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이제 개헌할 때”라 말하는 장면이었다. 어떻게 이런 날들을 견뎌왔을까? ‘촛불’이 없었다면, 지금도 대통령은 박근혜다.
지난해 ‘최순실’을 처음 드러낸 한겨레 특별취재팀을 이끌던 김의겸 선임기자가 회사를 떠났다. 후배 몇이 조촐한 환송파티를 열었다. 박재동 화백이 그려준 캐리커처에 ‘절대권력 무너뜨린 돈키호테’ 글귀가 적혀 있다. 내가 아는 김의겸은 ‘햄릿’이다.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82학번) 때,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주도 혐의로 옥살이도 했으나 ‘기자 김의겸’에게 ‘투사’는 겉으론 잘 안 보였다. 늘 고민하고, 조심하고, 소심하고, 망설이고, 그랬다. 특종보단 사안의 내면을 보여주는 분석 기사에 능했고, 기사에는 간간이 ‘주저흔’이 보였다. 이런 기자는 특종을 하기 힘들다. 환송회에서 누군가는 ‘열을 취재해 하나를 쓰는 기자’라 했고, 나는 ‘그래서 데스크가 싫어하는 기자’라 칭했다.
‘특종’과 ‘오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많다. 그 많은 ‘최순실 특종’ 중 ‘오보’와 ‘오버’(over)가 없었던 건 그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전에도 그의 기사는 촘촘한 팩트로 채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나 억측이 없어 좋았다. ‘조짐’ 기사도, 조짐당해 마땅한 사안에, 합당한 분량과 강도로, 선에서 딱 멈췄다. 그래서 ‘조짐’이 잔망스럽지 않고 품격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개헌 꼼수’와 <제이티비시>(JTBC)의 태블릿피시 보도가 터진 10월24일까지 김 선배가 이끈 특별취재팀이 쓴 ‘최순실’ 기사는 1면 머리만 14건이다. 그 한 달 외로운 싸움이었다. 지난해 10월31일 <기자협회보> 인터뷰에서 김의겸은 “우리 혼자만 이렇게 가다간 불씨가 사그라지고 말겠다는 위기감이 몰려와 다른 언론사가 전화번호나 문건 등을 요청하면 있는 대로 다 줬다” 했다. 이런 말도 했다.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 정유라씨의 2세, 고영태씨의 직업적 배경, 최순실씨의 종교적 문제 등이다. 그 부분은 가장 먼저 알고 있었으나,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인권의 문제라 생각했고,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봤다.”
언론 보도로 세상이 바뀌는 걸 목도하면서, 기성언론인 ‘레거시(legacy) 미디어’에 대한 재평가와 필요성이 대두했다. 그가 언급한 ‘조심’, ‘인권’, ‘본질’이 ‘레거시’의 명예와 품격을 지키는 것이라 본다. 기자 지망생이 늘고 있다고 했고, 한겨레에는 구독 문의와 주식 사겠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반가웠다. 하지만 그때도 ‘모르핀 주사’를 맞는 듯한 자조감이 가시진 않았다. 지금 ‘모르핀’ 기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온라인은 다시 ‘기레기’로 덮였고, 기성언론의 포털 하청기지화도 계속된다.
지난 6월 경력기자 실무 면접위원으로 참가했다. ‘왜 한겨레에 오려 하느냐’는 물음에, ‘쓰고 싶은 기사 쓸 수 있어서’라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 점도 있겠지만, 내게 직장으로서 한겨레의 좋은 점을 들라면 ‘좋은 사람들’이 떼로 몰려 있는 것이라 할 것 같다. 때론 ‘무엇을’보다, ‘누구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김 선배가 정치팀장이었을 때 청와대를 출입했다. 가끔 기사 지시에 “아닌데요”라고 어깃장을 놓곤 했다. 데스크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그를 얼마나 곤혹스럽게 한 건지, 나 대신 그가 얼마나 많은 번잡스러움을 거쳤을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젠 그러지 않을 텐데. 9월20일 ‘최순실 보도’ 1년, 김의겸 선배를 기억한다. h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