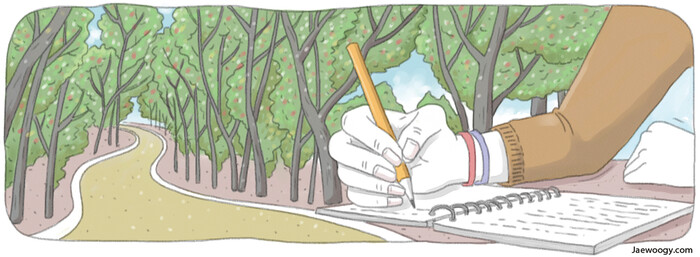
글을 쓰다가 길을 잃었다.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 기분이다. 이 글을 시작할 때는 나름 좁은 길을 택하거나 조금 느린 삶을 사는 젊은 세대 이야기로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써보겠다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공기가 일상에 너무 오래 뻗어 있기도 하고 주변에서 가끔 좀 더 ‘희망적인’ 또는 ‘밝은’ 글쓰기를 주문하는 일도 있어 위무가 될 칼럼을 써볼 참이었다.
맨 먼저 불러온 이야기는 지난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듣게 된 “걷기에 좋지 않은 길은 없다”이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또는 그냥 동인들이 뒤섞인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안부 겸 요즘 하고 있는 일을 돌아가면서 말하게 되었다. 한 참석자가 자기는 거의 매일 무작정 서울의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에서 걷기에 어디가 가장 좋으냐”고 누군가 물었고 그는 “걷기에 좋지 않은 길은 없다”고 툭 던지듯 답했다. 나는 그 제목으로 그가 요즘 걷고 있는 서울의 길들을 써보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양해를 얻어 인용부호를 붙여 이번 내 칼럼 제목으로 삼을 생각도 했다. 엑스(X)세대인 그는 40대 초반까지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이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중병을 알게 되어 바로 16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했다. 어머니 간병 일지를 쓰면서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다. 이제 탈상하고 몇년간의 ‘경단녀’ 생활을 정리하면서 걷는 일로 일상의 리듬을 찾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신림동에서 걷기를 시작해 한강을 건너 광화문 근처 내 사무실까지 오기도 했다. “걷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았다”고 옷의 빗방울을 털며 말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걷기에 가장 좋은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답을 툭 던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또는 ‘가장 빠른’ 한 방을 습관처럼 묻는 우리들을 잠깐 멈춰 세웠다.
내 연구실에서 그와 만나 그의 이야기에 잇대어 쓰고 싶은 어느 고등학생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 편지는 사회학이란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보낸 편지였다. 이메일 주소도 휴대폰 번호도 없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름과 학년과 반이 적혀 있었고 학생 이름으로 오는 편지는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담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철거 재개발에서 만난 한 가족을 사례로 쓴 책을 읽고 질적 연구 방법과 사회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또박또박 볼펜으로 쓴 편지였다. 내가 퇴임한 대학으로 보내진 그 편지는 돌고 돌아 내 손에 3개월 만에 왔다. 그와 나는 이메일 주소도 휴대폰 번호도 없이 담임 이름을 겉봉에 빌려 쓴 고2 학생이 보내온 도시 빈민에 대한 관심과 글 읽기에 놀라워하며 속도에 열광하는 디지털세대에게도 우리가 몰랐던 느림에 대한 감수성이 있음에 공감하고 기뻐했다.
칼럼을 쓰다 초고에 대한 구상을 들은 후배 사학자가 짧은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의 주소도, 핸드폰 번호도 없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이름과 학년과 반, 담임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편지는 대학 입시를 겨냥한 생활기록부(일명 생기부)용 편지입니다. ……” 거기에 덧붙여 혹시나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싶어 “재작년, 작년 올해 입시를 치른 아이 엄마들에게 에둘러 물어봤더니 ‘백퍼(100%) 생기부용’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메일을 보낸 후배는 몇달 전 내 방에 들러 우연히 그 편지를 봤다. 나는 인기도 없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고등학생이 기특해서 답장을 보낼 생각이었고 그 편지 봉투를 읽고 있던 책 갈피에 꽂아두었다. 그 책은 프랑스 사회학의 거장 피에르 부르디외와 아날학파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로제 샤르티에의 대담집 <사회학자와 역사학자>였다. 그 책을 사서 읽고 있었는데 같은 책을 번역자로부터 선물받아 후배 사학자한테 ‘불하’하려던 참이어서 그 고등학생 편지가 두 권 중 어디에 꽂혔는지 찾다가 그 편지 이야기를 했었다. 후배는 이미 그때 그 편지에 대한 감을 잡았던 듯한데 그냥 지나갔다. 우리는 당대를 대표하는 사회학자와 역사학자가 대중용 라디오 대담에 나와 각자의 전공을 배경으로 깊이 있는 논쟁을 펴는 프랑스의 지적 풍토를 부러워하며 거기에 몰두했다. 샤르티에가 부르디외에게 이제는 지식인의 역할이 피지배 대중에게 지배 메커니즘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일로 보는 거냐고 짚는 질문을 곱씹기도 했다. 우리가 그들만큼 격조 있는 지적 대화는 못 하더라도 우리 사회 밑바닥을 훑고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생기부용’ 편지임을 지적하는 메일을 받고 낭패감이 몰려왔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왜 글을 읽고 쓰는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없는 회의에 빠져들었다. 우리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그런 ‘생기부용’ 편지라도 써서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부터 이런 일을 기획하며 담당 교사와 학생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지도를 주고받는지 같은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최근까지 학원에서 중학생 국어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내 연구실 조교에게 그 편지가 ‘생기부용’일 확률과 ‘순수하게 자발적인’ 편지일 확률을 물었더니 “후자라고 답하고 싶기는 하지만”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더니 그게 걸렸는지 “분명 아이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뭔가 다른 곳으로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싶어 했다. 그게 지식생산 지배층인지, 꼼수와 정의로 위장한 정치판인지 모르겠다.
나와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엑스세대와 함께 그와 다시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 새로운 세대의 상큼한 의젓함을 이야기하는 칼럼으로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내 연구실에 들른 제자들이 풀어놓고 간 남동생이나 조카들의 이야기를 둘러싼 그와 나의 해석과 분석도 시들해졌다. 평범한 사회초년생인 남동생이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함께 〈82년생 김지영〉을 보려다 여친에게 자기 페미니즘 감수성을 들킬까 봐 겁이 나서 혼자 보고 왔다는 이야기 또는 조카가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여친과 함께 성병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서로에게 보여주기로 했다고 이모한테 주삿바늘 흔적이 있는 팔뚝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들에서 작은 밝음도 읽고 싶었다. 윗세대의 위선과 프레임에 코웃음 치는 젊은 세대의 등장은 ‘희망적’이라고 덧붙이고 일상을 멈춰 세우며 머뭇거린 경험은 때로 예기치 않은 사유의 공간과 위무의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끝맺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 유감이다.

조은 ㅣ 사회학자,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