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시집 ‘에르고스테롤’ 낸 박순원
자기희화화 속 서늘한 비판 메시지
“창작의 고통이란 게 뭔가요?”
자기희화화 속 서늘한 비판 메시지
“창작의 고통이란 게 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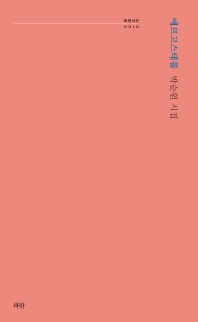
에르고스테롤
박순원 지음/파란·1만원
박순원 지음/파란·1만원
이렇게 웃기는 시집이라니! ‘개콘보다 웃기는 소설’(박형서, <한겨레> 2006년 9월15일치 섹션 15면 참조)에 이은, <미우새> ‘쉰건모’보다 웃기는 시집의 출현인가.
박순원 시집 <에르고스테롤> 이야기다. 2005년 <서정시학>을 통해 등단해 그동안 시집 세 권을 낸 이 시인의 존재를 미처 몰랐더랬다. 그런데 새로 나온 네번째 시집 <에르고스테롤>을 읽으면서 그 능청과 해학에 홈빡 빠지고 말았다. 이런 식이다.
“나의 알량한 지식은 목숨을 건 비약을 통해 강의가 된다 나의 맥 빠진 강의는 또다시 목숨을 건 비약을 통해 상품이 된다 한 시간에 삼만팔천 원 또는 사만오천 원 운이 좋으면 육만이천 원 (…) 나의 감성과 느낌과 헛소리가// 시가 되기도 한다 역시 목숨을 건 비약이다”(‘비약 삐약삐약’ 부분)
“한참 이름을 부르다 기타 등등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다 등등 우리는 평등하다 기타를 메고 가는 무리의 뒷모습 무리 지어 몰려다니는”(‘기타 등등’ 부분)
낄낄거리며 책장을 넘기다 보니 시를 쓴 ‘사람’이 궁금해졌다. 광주대에 재직 중인 그가 모처럼 서울에 오는 날짜에 맞춰 지난 24일 오후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저는 성격 자체가 낙천적인데다, 원래가 말이 많고 재밌다는 평을 듣는 편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재밌는 얘기를 쓸 뿐이지 특별히 시를 쓴다는 의식은 없어요. 시집 읽고 나서, ‘시와 사람이 똑같다. 네가 옆에서 떠드는 것 같더라’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의 독후감이 저한테는 가장 흔쾌합니다.”

신작 시집 <에르고스테롤>을 펴낸 박순원 시인. “시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가 아니라, 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시집 <에르고스테롤> 펴낸 박순원 시인.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시집 <에르고스테롤> 펴낸 박순원 시인.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첫눈에 웃는 인상이,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시를 닮았다. “이 정도면 나도 쓰겠다 싶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온몸으로 쓰기 시작했다”(‘김수영 시를 보고’)라거나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간 것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정말 높구나”(‘어쩌다 마주친’)처럼 장난 같기도 하고 낙서 같기도 한 시를 읽으면서 상상했던 얼굴 거의 그대로였다. 편안하고 유쾌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쓰기 쉬운 게 시라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되고, 이 말 하다 저 말 해도 되고, 엉뚱하게 써도 되는 게 시니까요. 아무렇게나 써 놓고도 누가 ‘이게 왜 이래요?’ 하면 ‘이건 시예요’라고 답하면 되거든요. 하하. 전 창작의 고통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요.”
허허실실이라고, 시종 웃으며 농담처럼 말하긴 해도 사실 그의 시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는 주로 자신의 허위의식과 속물근성을 희화화하며, 그러니까 제 온몸을 던져 가며 독자를 웃기는데, 그런 그를 보며 무릎을 치고 낄낄거리던 독자는 어느 순간 그의 칼끝이 겨냥하는 게 시인만이 아니라 그 시를 읽으며 웃는 독자 자신이기도 하다는 서늘한 깨달음에 이른다. 의미 없는 재담으로 포장한 그의 시들이 지닌 반어적 사회 비판 메시지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분홍당 나는 분홍 빛깔로 당을 만들겠다 온 세상을 녹색으로 물들이려는 세력들을 저지하겠다 (…) 어여쁘고 가냘프고 소심하고 수줍은 정관을 작성하고 지조도 의리도 신념도 개념도 없는 당원들과 닐리리야 전당대회를”(‘녹색당’ 부분)
“나는 까짓것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표절하겠다 (…)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표절 아무 목적도 없는 표절 비실비실하는 표절 호기롭게 베끼다가 그냥 제풀에 흐지부지 꼬리를 내리는 표절의 존재를 증명하겠다”(‘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부분)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거의 한 호흡에 시를 쓴다”고 그는 말했는데, 그 때문인지 그의 시는 한달음에 술술 읽힌다. 소리 내어 낭독하면 효과가 더 클 성싶다. 유머감각을 뒷받침하는 언어감각 덕분이겠다. “외톨이에서 톨을 보아라 외는/ 조금 한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는 접미사처럼 보인다 외톨이를/ 외톨이답게 하는 것은 톨이다”(‘톨’), 또는 “ㄹ은 설측음 혀 옆으로/ 랄랄라 랄랄라 신나게/ 소풍을 가는데/ 우뢀뢀뢀라 우뢀뢀뢀라/ 미국 노래를 부르다 보면/ 혀가 말리기도 하지”(‘ㄹ’ 전문) 같은 시가 대표적이다.
“시에 관한 이런저런 담론들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 재미난 얘기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울하고 진지해야만 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